-
-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AI-based Webtoon Creation - The Case of ‘Lee Hyun-se AI Project’ -
AI를 활용한 웹툰 창작의 가능성과 한계 - ‘이현세 AI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
Yu, Konshik
유건식
- This study analyzes the industr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webtoon production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the “Lee Hyun-se AI Project,” …
본 연구는 웹툰 제작사 재담과 세종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대표 만화가 이현세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현세 A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 제작의 실제 …
- This study analyzes the industr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webtoon production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the “Lee Hyun-se AI Project,” a collaborative initiative by Jaedam Media, Sejong University, and renowned Korean cartoonist Lee Hyun-se. The project involved training AI on the artist’s distinctive style and four-decade oeuvre, and then using this knowledge to remake his past work, “Dawn of Charon,” as a color webtoon.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modes of collaboration between creators and AI, as well as the technological and artistic limitations, and issues of copyright and creativity.
The research employ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based on project report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exper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AI excels at repetitive image generation and style replication, human creators are indispensable for maintaining character consistency, expressing details, and ensuring creative direction. Notably, although the remade webtoon successfully reproduces much of the original’s style, it somewhat diminishes the unique intensity and gravitas of the source material, and the fast-paced direction characteristic of the webtoon format tends to dilute the narrative depth.
This project, as the first empirical case in Korea to go beyond mere technical experimentation, vividly demonstrates changes in the creative ecosystem in the AI era. It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future models of AI-human collaboration, restructuring copyright systems, and building sustainable business models for the webtoon industry.
- COLLAPSE
본 연구는 웹툰 제작사 재담과 세종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대표 만화가 이현세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현세 A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 제작의 실제 사례와 그 산업적ㆍ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AI가 작가의 40여 년간의 화풍과 작품 세계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작품인 『카론의 새벽』을 컬러 웹툰으로 리메이크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자와 AI 간의 협업 방식, 기술적ㆍ예술적 한계, 그리고 저작권과 창작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는 프로젝트 보고서 분석과 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AI는 반복적 이미지 생성과 스타일 복제에 강점을 보이지만,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 디테일한 표현, 연출의 창의성 등에서는 인간 창작자의 보완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리메이크된 웹툰은 원작의 화풍을 상당 부분 재현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원작 특유의 강렬함과 무게감은 다소 약화되었으며, 웹툰 형식의 속도감 중심 연출은 서사 구조의 깊이를 희석시켰다는 의견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AI 시대 창작 생태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 정립, 저작권 체계 재정비, 지속 가능한 웹툰 산업 모델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AI-based Webtoon Creation - The Case of ‘Lee Hyun-se AI Project’ -
-
-
Study of Artistic Identity Through ‘Seeing’ and ‘Writing’ - Focusing on Christian Petzold’s Afire -
‘보기’와 ‘쓰기’를 통한 예술가 정체성 연구 - 크리스티안 페촐트 Christian Petzold의 <어파이어 Roter Himmel>를 중심으로 -
-
Goak, Jeang-Yean
곽정연
- Christian Petzold’s Afire can be interpreted through various lenses, including melodrama, disaster film, coming-of-age narrative, and summer vacation story. This study analyzes …
본고는 로트만 Juri Michailowitsch Lotman의 문화기호학 이론을 활용해 페촐트 Christian Petzold의 <어파이어 Roter Himmel>에서 핵심적인 주제인 보기와 쓰기에 주목하여 주인공 레온 Leon이 …
- Christian Petzold’s Afire can be interpreted through various lenses, including melodrama, disaster film, coming-of-age narrative, and summer vacation story. This study analyzes the protagonist’s search for artistic identity using Yuri Mikhailovich Lotman’s cultural semiotic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film’s central themes of seeing and writing. The analysis also considers how the film engages with contemporary social issues.
Leon, the protagonist, defines others by their professions, dismissing those in so-called “simple” jobs and distancing himself from them. In his struggle to complete his second novel and prove himself as an artist, Leon loses control over his time and work, becomes socially isolated, and, trapped by his own prejudices and delusions, fails to perceive or understand the world around him.
It is only after a catastrophic event that Leon confronts his own shortcomings and acquires the ability to reconstruct his memories and write authentically. In Lotman’s terms, this catastrophe functions as a “cultural explosion,” disrupting continuity and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self-awareness and growth. The film demonstrates how catastrophe can trigger positive transformation by bringing suppressed memories and marginalized perspectives from the periphery into the protagonist’s self-narrative.
Petzold expands the interpretive scope of the film by exploring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seeing and writing, while integrating intertextual references to literature. Leon embodies the modern individual: dissatisfied, enslaved by work, unable to appreciate the kindness of others, to engage in meaningful interactions, or to enjoy life. His refusal to “look around” serves as a metaphor for humanity’s indifference to and ignorance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Thus, the film explores the artist’s identity while simultaneously delivering a warn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Earth, symbolized by the wildfires.
- COLLAPSE
본고는 로트만 Juri Michailowitsch Lotman의 문화기호학 이론을 활용해 페촐트 Christian Petzold의 <어파이어 Roter Himmel>에서 핵심적인 주제인 보기와 쓰기에 주목하여 주인공 레온 Leon이 소설가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영화가 제기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성찰한다. 레온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규정하면서 소위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과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다. 두 번째 작품을 집필 중인 레온은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쓰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점차 시간과 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그는 일에 쫓기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며 망상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 선입견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쌓은 벽에 갇혀 있던 레온은 재앙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비로소 기억을 재구성하여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페촐트는 보기와 쓰기의 상호작용성, 문학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생성하면서 영화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 레온은 일의 노예가 되어 주변의 친절과 배려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면서 고립되어 삶을 즐기지 못하고 불만에 차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주변을 살피지 않는 레온의 모습은 환경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우리 사회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레온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산불로 상징되는 지구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함께 전한다.
-
Study of Artistic Identity Through ‘Seeing’ and ‘Writing’ - Focusing on Christian Petzold’s Afire -
-
-
Character Analysis of Netflix’s <Daily Dose of Sunshine> - Creating Identity Beyond Institution -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캐릭터 분석 - 제도를 넘어 새롭게 창조되는 정체성 -
-
Kang, Bo-ra ・ Kim, Ki-duk
강보라 ・ 김기덕
- This study analyses the main characters of the Netflix series <Daily Dose of Sunshine> using a ‘Tri-Origin Character Theory’. Syd Field’s paradigm …
본 연구는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주요 인물을 ‘삼원 캐릭터 이론’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드 필드의 패러다임(Syd Field’s Paradigm)에 …
- This study analyses the main characters of the Netflix series <Daily Dose of Sunshine> using a ‘Tri-Origin Character Theory’. Syd Field’s paradigm is the foundation for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tory, which is divided into three acts. Act I, termed ‘Daily Life’; Act II-1 and Act II-2, termed ‘Attempted Change’; and Act III, termed ‘Mature Completion’.
Next, a full-scale character analysis using the Tri-origin Theory is attempted. Characters are assigned to roles corresponding to Hetero (Initiator) for forces that drive change, Homo (Responder) for forces that resist change, Neutro (Completor) for forces that enable existence, and Neuto (Enlightener) for the spirit of existence. A character triangle is then diagrammed in accordance with the three-act structure.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Jung Da-eun, a character who embodies the diverse experiences within the series, transforms from a kind nurse to a competent one, then to a frustrated nurse, and finally to a hopeful one. Confronting the ‘human group within society and the hospital environment’ (Hetero: Initiator), she grows from a ‘problematic patient’ (Homo: Responder) to a ‘person with an established self-identity’ (Neutro: Completor). This transformation was only possible after redefining the ‘erroneous Neuto’ of institutions, embedded in a collective identity of standardization, into the ‘correct Neuto’ (meaning Enlightener) representing human dignity. As a result, both the patients and Jung Da-eun transform into characters who acquire the ultimate values of hope, humanization, and human liberation (Neutro: Completor), metaphorically represented as ‘morning’ in the series title.
The series’ core proposition, “We are all borderlanders on the boundary between normal and abnormal,” prompts a question about what true empathy entails. Furthermore, the series encourages us to reflect on whether we are immersed in collective identity, and if, by detaching from the power inherent in our external identity, we might also be complicit in structural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eries has successfully and to a certain degree actualized these themes in its overall quality and viewership ratings. This paper offers a detailed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the entire narrative progression of <Daily Dose of Sunshine>, using the Tri-origin Character Theory to examine the main characters’ transformations. We hope that the ‘Tri-origin Character Theory’ can contribute to the field of character theory, which is currently in a state of arrested development.
- COLLAPSE
본 연구는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주요 인물을 ‘삼원 캐릭터 이론’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드 필드의 패러다임(Syd Field’s Paradigm)에 근거하여 ACTⅠ을 ‘일상생활’, ACTⅡ-1과 ACTⅡ-2를 ‘변화 시도’, ACTⅢ를 ‘성숙 완성’으로 명명한 3막 구조로 전체 스토리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삼원론을 활용한 캐릭터 이론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코자 하는 힘의 헤테로(시작자), 변치 않고자 하는 힘의 호모(대응자), 존재케 하는 힘의 뉴트로(완성자), 존재정신의 뉴토(깨달은자)에 맞게 배정하고, 3막 구조에 따라 그림으로 제시된 ‘캐릭터 트라이앵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시리즈의 모든 캐릭터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다은은 친절한 간호사에서 유능한 간호사→좌절한 간호사→희망을 찾은 간호사를 거치며, ‘사회ㆍ병원 환경 속 인간군’(헤테로:시작자)에 맞서 ‘문제 있는 환자’(호모:대응자)에서 ‘자아정체성을 갖춘 사람’(뉴트로:완성자)으로 성장한다. 그것은 ‘표준화라는 집단정체성’(잘못된 뉴토)에 매몰되어 제도에 순응한 상태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올바른 뉴토(뉴토:깨달은자)를 재정립한 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환자들과 주인공 정다은은 모두 본 시리즈의 제목인 ‘아침’으로 은유되는 희망ㆍ인간화ㆍ인간해방이라는 최종 가치를 획득한 캐릭터(뉴트로:완성자)로 변화한다. ‘우리 모두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이라는 본 시리즈의 핵심 명제는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집단정체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외적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탈피하여 나 역시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에 동조한 구성원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본 시리즈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작품 완성도 부분에서나 시청률에서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추구하는 전체 전개과정을 삼원 캐릭터 이론을 갖고 주요 캐릭터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세히 분석ㆍ제시하였다. 현재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캐릭터 이론에서 ‘삼원 캐릭터이론’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Character Analysis of Netflix’s <Daily Dose of Sunshine> - Creating Identity Beyond Institution -
-
-
Women Who No Longer Love RPS - The Intersect and Transfer Between RPS and Original BL Content Consumption -
더 이상 RPS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들 - RPS와 오리지널 BL 콘텐츠 소비문화의 교차와 전이 -
-
Kang, MinJi・Jeong, YuJeong・Jang, MinGi
강민지 ・ 정유정 ・ 장민지
-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engaging with RPS (real person slash), a form of secondary creative culture within Korean idol fandoms, …
본 연구는 국내 아이돌 팬덤 내 2차 창작 문화 중 하나인 RPS(Real Person Slash)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이 오리지널 BL(Boys’ Love) 콘텐츠 …
-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engaging with RPS (real person slash), a form of secondary creative culture within Korean idol fandoms, focusing on how such engagement expands into the consumption of original BL (boys’ love) content. Closely tied to idol fandom activities, RPS—due to its basis of using real persons’ identities— exhibits a complex consumption pattern in which immersion and non-immersion coexist. This study thus explores, in depth, how RPS users experience consumption stress, and if they expand their interest toward original BL content based on fictional worlds to alleviate such stress.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ur findings indicate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RPS-related stress stemming from fandom norms, societal perceptions, and the tension between reality and fantasy, and that they extended their interest to original BL content grounded in fictional worlds as a way to mitigate this stress. This expansion emerged not as a simple substitution of consumption but as a process of broadening the scope of cultural practices available to the users. However, creators of original BL content have also increasingly developed monetization structures under the logic of capitalism, carrying the potential for another form of dependency within participatory culture.
In terms of significance, this study identifies how women’s cultural experiences are reshaped within the intertwined contexts of fandom, industry, and capitalism, and raises the issue of securing user subjectivity and autonomy within the subculture industry.
- COLLAPSE
본 연구는 국내 아이돌 팬덤 내 2차 창작 문화 중 하나인 RPS(Real Person Slash)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이 오리지널 BL(Boys’ Love) 콘텐츠 소비 주체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아이돌 팬덤 활동과 깊은 연관을 가진 RPS는 실존 인물 기반 창작이라는 특성상 몰입과 비몰입이 공존하는 복합적 소비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RPS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팬덤 내부 규범과 사회적 시선, 실존 인물성과 환상성 간의 긴장을 통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허구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오리지널 BL 콘텐츠 소비로 확장하는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팬덤 내부 규범, 사회적 시선, 실존 인물성과 환상성의 긴장 속에서 RPS 이용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허구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 BL 콘텐츠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한 대체 소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실천의 폭을 넓히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리지널 BL 콘텐츠 역시 점차 자본주의적 논리 하에 수익화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참여문화 종속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연구 의의로, 본 연구는 여성 이용자들의 문화적 경험이 팬덤, 산업, 자본주의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규명하고, 서브컬처 산업 내에서 이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
Women Who No Longer Love RPS - The Intersect and Transfer Between RPS and Original BL Content Consumption -
-
-
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in Hear Me - Focusing on the Taiwanese Original and the Korean Remake -
영화 <청설>의 언어ㆍ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 대만 원작과 한국 리메이크 버전을 중심으로 -
-
Xu Lu
서로
- The 2009 Taiwanese film Hear Me was remade in Korea in 2024 under the same title. Both center on hearing-impaired characters and …
2009년 개봉한 대만 영화 <聽說>는 2024년 한국에서 <청설>이라는 동명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으며, 두 작품은 모두 청각장애인을 중심 인물로 설정하여 ‘청춘’, ‘가족’, ‘사랑’이라는 공통된 …
- The 2009 Taiwanese film Hear Me was remade in Korea in 2024 under the same title. Both center on hearing-impaired characters and explore the themes of youth, family, and love. While the two share similar narrative frameworks, they differ considerably in how these themes are represented, reflecting their distinct production contexts, emotional sensibilities, and cultural values. Rather than a simple reproduction, the remake functions as a site of cultural translation, recontextualizing affective structures and social discourses. This study positions the two films as a meaningful case for examining emotional represent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Asian cinema.
The analysis draws on cultural translation theory, semiotics, and affect theory, comparing both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elements, as well as explicit and implicit cultural codes. Verbal expressions (dialogue, written text, sign language) and non-verbal signs (gesture, facial expression, background music) are examined to reve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action. Culturally, the study focuses on spatial design, character roles, and narrative events, along with values regarding love, dreams, relational sensitivity, and gender roles.
Findings show that Hear Me reflects changes in Korean society—inclu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leisure culture, and socio-economic shifts—resulting in different narrative and emotional strategies. While Hear Me in Taiwan uses direct and symbolic expressions, parallel structures, and traditional plot progression to heighten emotion, Hear Me in Korea adopts a more restrained and emotionally nuanced style using degree adverbs, descriptive tone, and casual language. This reflects the affective sensibilities of Korea’s younger generation. Culturally, Hear Me in Taiwan emphasizes female subjectivity, idealism, and traditional views on romance and marriage, whereas Hear Me in Korea presents patriarchal narrative structures, realism, and the “k-first daughter” phenomenon in sisterhood, and more open attitudes toward love. It also highlights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balance, mirroring contemporary Korean youth values.
Ultimately, both films suggest that love and dreams can transcend spoken language, even translation, through emotion and gesture. By portraying the experiences of a marginalized group—the hearing-impaired—they open new perspectives 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motional transmission. This comparative study thus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cultural exchange and affective reception function in East Asian media.
- COLLAPSE
2009년 개봉한 대만 영화 <聽說>는 2024년 한국에서 <청설>이라는 동명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으며, 두 작품은 모두 청각장애인을 중심 인물로 설정하여 ‘청춘’, ‘가족’, ‘사랑’이라는 공통된 테마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서사 구조를 공유한다. 그러나 두 작품은 제작된 시기와 사회문화적 맥락, 정서 코드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리메이크 영화가 단순한 서사의 반복을 넘어, 각기 다른 사회의 정동 구조와 문화 담론을 재맥락화하는 하나의 ‘문화 번역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聽說>과 <청설>의 비교는 현대 아시아 영화 간의 감정 재현 양상 및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를 조명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聽說>과 <청설>을 대상으로 하여 두 작품이 공통된 주제를 각 지역의 문화적 정서와 사회적 감각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재해석하고 재현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때 분석의 이론적 틀로는 문화 번역론, 기호학 이론, 그리고 문화적 정동 구조 이론을 채택하였으며,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과 명시적ㆍ암시적 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구성상, 언어적 분석에서는 대사, 문자, 수어 등 언어 기호는 물론, 몸짓, 표정, 배경 음악 등 비언어 기호까지 포괄하여 감정 표현 방식과 상호작용 양상의 문화적 차이를 살폈다. 문화적 비교 분석은 공간 구성, 사건 배치, 인물 설정 등 명시적 문화 요소와 더불어, 사랑과 꿈에 대한 인식, 관계 감수성, 성역할 기대와 같은 암시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리메이크판은 통신 기술, 여가 문화, 사회경제적 변화 등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사 구조 및 표현 방식이 원작과는 상이하게 재구성되었다. 언어적 측면에서 <聽說>은 직설적이고 상징적인 감정 표현, 반복적 병렬 구조, 정적인 표현을 통한 정서 고조, 전통적인 기승전결 서사 구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청설>은 간접적이고 감성적이며 설명적인 감정 표현, 정도부사를 활용한 미세한 정서 강조, 일상적 말투를 통한 감정 리듬 구성 등 섬세한 감정 운용이 특징적이다. 특히 한국판의 감정 절제, 관계의 균형, 서사 리듬의 일관성은 젊은 세대의 문화 감수성과 정서 코드를 반영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만판 <聽說>이 여성의 주체성과 이상주의, 연애 및 혼인에 대한 보수적ㆍ전통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데 비해, 한국판 <청설>은 가부장적 서사 구조, 현실 기반의 리얼리즘, 자매관계 속의 ‘k-장녀’ 현상, 연애와 혼인에 대한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또한 남녀 주인공 간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수직적 보호 관계보다 수평적 교류와 상호 조화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두 작품은 ‘사랑’과 ‘꿈’이 반드시 들리거나 말해지지 않아도, 심지어 번역되지 않아도, 감정과 몸짓을 통해 언어를 초월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시사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이라는 소수자 집단의 재현을 통해, 비가청적 소통 가능성과 감정 전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같은 비교문화적 분석은 아시아 지역 간 문화 교류 양상은 물론,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정서 구조와 미디어 수용자의 감응 메커니즘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in Hear Me - Focusing on the Taiwanese Original and the Korean Remake -
-
-
The Meaning of Fantasy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Immersive Exhibitions
몰입형 전시의 특성에 따른 환상성의 의미 연구
-
Jung, Yeaeun・Lee, Byungmin
정예은 ・ 이병민
- This study focuses on immersive exhibitions, an emerging exhibition format,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elucidating the meaning …
본 연구는 새로운 전시 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몰입형 전시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몰입형 전시는 …
- This study focuses on immersive exhibitions, an emerging exhibition format,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elucidating the meaning of fantasy as it appears in their content. Beyond merely mediating artistic experiences, immersive exhibitions are increasingly establishing themselves as an independent domain through the rise of commercial exhibition content and professional creative groups that prioritize the immersive experience itself.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cademic discussion on the unique experiential value and identity of such content.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immersive exhibitions in terms of technological features and multisensory experiences. In contrast, this study adopts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at conceptualizes immersive exhibitions as experiences of heterogeneous simulated environments and draws attention to the accompanying element of fantasy.
To this end, it examines theoretical discussions of fantasy at the formal leve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its structural foundations in spatial contexts. Building on this theoretical groundwork, the study analyzes the manifestation of fantasy in two immersive exhibition cases—teamLab Planets and Arte Museum Jeju—categorizing them into rhetorical structures of sameness and difference at the structural level, and into the enactment of visitor hesitation and collaborative fantasy at the performative level.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dimensions of fantasy in immersive exhibitions. First, the fantasy constructed within immersive exhibitions functions as a commodified experiential product. Second, fantasy serves as a mechanism for transformation and the reconfiguration of perception, thereby inducing immersion. Finally, the study points to the necessity of a content circulation system grounded in reality.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expands the discourse on immersive exhibition content and offers insights into the significance and future potential of immersive formats within contemporary exhibition culture.
- COLLAPSE
본 연구는 새로운 전시 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몰입형 전시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몰입형 전시는 예술 경험의 매개를 넘어 몰입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전시 콘텐츠 및 전문 창작 집단의 등장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차별적 체험 가치와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은 몰입형 전시의 특성을 주로 기술적 요소나 다감각적 체험 요소 중심으로 설명해왔다. 본 연구는 몰입형 전시를 이질적인 모의 환경의 체험으로 보는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환상성에 주목함으로써 몰입형 전시 콘텐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식 차원에서 환상성을 논의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특히 공간적 맥락에서의 성립 구조를 고찰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팀랩 플래닛’과 ‘아르떼 뮤지엄 제주’의 콘텐츠 사례에서 환상성이 구현되는 양상을 구조적 차원에서 동일성의 수사, 차이성의 수사로, 실천적 차원에서 체험자의 망설임 구현, 환상의 공모로 나누어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환상성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몰입형 전시가 만들어낸 환상이 새로운 체험 상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환상성을 통한 변형가능성과 지각의 재구성으로서 몰입의 유도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순환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몰입형 전시의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함과 동시에, 몰입형 방식이 전시 문화에서 갖는 의의와 향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The Meaning of Fantasy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Immersive Exhibitions
-
-
Postcolonial Appropriation and Cultural Subjectivity in the Korean Musical Adaptation of “The Rose of Versailles”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본 한국 창작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의 문화적 전유와 주체성 재구성 전략
-
Qu, Cai Wei・Chang, WoongJo
곡채유 ・ 장웅조
-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2024 Korean musical adaptation of “The Rose of Versailles,” produced by EMK Musical Company, from a postcolonial …
본 연구는 2024년 EMK 뮤지컬 컴퍼니가 제작한 한국 창작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를 대상으로,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일본 원작 콘텐츠에 대한 한국 공연예술계의 비판적 …
-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2024 Korean musical adaptation of “The Rose of Versailles,” produced by EMK Musical Company,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ritical appropriation and decolonial adaptation strategies utilized by Korean performing arts creators in reinterpreting Japanese source material. Based on Riyoko Ikeda’s original manga and its subsequent adaptation by the Takarazuka Revue, this production dismantles the original narrative, integrating distinctively Korean aesthetics and sensibilities to construct an independent and active cultural subjectivity. Employing key postcolonial concepts such as Edward Said’s “contrapuntal reading,” Homi Bhabha’s “mimicry” and “hybridity,” and Gayatri Spivak’s “subaltern,”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examines narrative structures, character portrayals, visual stage languages, bodily performances, and audience reception. It demonstrates how Korean creators strategically decentralize the symbolic authority of Japanese popular culture, thus actively establishing autonomous cultural identities through performative acts of appropriation.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a practical example of negotiated and creative cultural reinterpretation within the East Asian cultural power dynamics, empirically validating the potential of postcolonial practice in East Asian performing arts.
- COLLAPSE
본 연구는 2024년 EMK 뮤지컬 컴퍼니가 제작한 한국 창작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를 대상으로,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일본 원작 콘텐츠에 대한 한국 공연예술계의 비판적 전유(appropriation) 및 탈식민주의적 각색 전략을 분석한다. 일본 만화가 이케다 리요코의 원작과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각색 공연을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원작의 서사를 해체하고 한국적 미학과 정서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문화적 주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대위적 독해’, 호미 바바의 ‘모방(mimicry)’과 ‘혼종성(hybridity)’,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subaltern)’ 등 포스트식민주의의 주요 개념을 통해 뮤지컬의 서사 구조, 인물 설정, 무대 시각언어, 신체 수행 및 관객 수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창작자들이 일본 대중문화의 상징적 권위를 탈중심화하며, 문화적 전유의 수행적 실천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주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은 또한 기존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재서사화의 사례를 제시하며, 동아시아 공연예술의 탈식민적 실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
Postcolonial Appropriation and Cultural Subjectivity in the Korean Musical Adaptation of “The Rose of Versailles”
-
-
A Study on the Early Settlement Experiences of Koryoin Refugees from Ukraine in South Korean Society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
Park, Mi Suk
박미숙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arly settlement experiences of Koryoin (ethnic Koreans from Ukraine) who entered South Korea following Russia’s invasion …
본 연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피난민들의 초기 정착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재외동포’라는 법적 …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arly settlement experiences of Koryoin (ethnic Koreans from Ukraine) who entered South Korea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Although they hold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se individuals exist at the intersection of war refugees and economic migrants, embodying a hybrid and liminal identity.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Koryoin evacuees as boundary subjects who do not conform to fixed national or cultural categories and examines the full trajectory of their resettlement, including initial adaptation, livelihood strategies, family reunification, and long-term settlement plans in Korea. Using a narra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conducte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Koryoin participants who arrived after 2022. Their life stories were reconstructed and analyzed along temporal and contextual dimens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despite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such as language barriers, legal restrictions, and economic instability—participants actively utilized informal support networks including religious institutions, NGOs, and Koryoin communities to secure basic living conditions. Caught between temporary stay and long-term settlement, and between returning home and reconstructing life in Korea, the evacuees continually renegotiate their identities through concrete practices such as pursuing children’s education, reuniting with family members, and seeking housing stability. Although they share a common ethnic background, their adaptation strategies diverged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available resource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study positions Koryoin evacuees not merely as diaspora or refugees but as liminal agents navigating the boundaries of identity, policy, and survival. Based on their multilayered settlement experiences, the study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context-sensitive integration policies to address the structural blind spots in Korea’s current immigration and diaspora frameworks.
- COLLAPSE
본 연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피난민들의 초기 정착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재외동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전쟁 피난민과 경제 이주민의 경계에 위치한 혼합적 정체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려인 피난민을 고정된 국적ㆍ문화 범주에 귀속되지 않는 경계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과 생계유지 전략, 가족 구성과 장기 체류 계획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2022년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시간적ㆍ맥락적 흐름에 따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려인 피난민들은 언어 장벽, 법적 제약, 생계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기관, NGO, 고려인 공동체 등의 비공식적 지원망을 활용하여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시적 체류와 장기적 정착, 고국 귀환에 대한 갈등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며, 자녀 교육, 가족 재결합, 주거 안정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출신 배경을 가졌음에도 개인의 조건과 자원, 제도적 환경에 따라 적응 전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려인 피난민을 단순한 재외동포나 피난민이 아닌 경계적 주체로 이해하고, 이들의 다층적 정착 경험에 기반한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A Study on the Early Settlement Experiences of Koryoin Refugees from Ukraine in South Korean Society
-
-
Webtoon of <Pyramid Game> - Research of Drama Transformation Strategy and Viewer Response -
웹툰 원작 <피라미드 게임>의 성공적인 드라마 전환 전략 연구
-
Cho Hyun ah・Mok Ji Young・Park Kiyoung・Kenneth Chi Ho Kim
조현아 ・ 목지영 ・ 박기영 ・ 김치호
- This research analyzes gamified and emotional narratives of popular webtoon <Pyramid Game>. which converted into a drama, and explores viewer responses to …
본 연구는 인기 웹툰 <피라미드 게임>이 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임화 설정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 중심의 서사 방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시각적ㆍ매체적 특성에 …
- This research analyzes gamified and emotional narratives of popular webtoon <Pyramid Game>. which converted into a drama, and explores viewer responses to this transformation.
<Pyramid Game> is considered as a successful instance of content converted into a drama.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original webtoon’s gamified narrative devices are strategically conver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ama medium.
According to the study, the webtoon <Pyramid Game> used the rule of pyramid game. The recipients of F grade are subjected to bullying and violence. This showcases the fictionality of social hierarchy and presents a discourse of critical perception.
The ranking system was ‘visualized by grade’ by using elements like color, seating assignments, and details of uniform. Voting processes were visualized by using suspenseful background music. Complex games rules were produced with multi-dimensional effects by utilizing animation and graphics.
Emotional narratives of characters demonstrate not just recreation of webtoon but also strategies of drama transformation. The use of ‘layering of emotion’ and ‘rhythm of emotions’ through actors’ delicate expressions, gestures, tones and gazes bring ‘spread of emotion’ effect, expanding individual growth narratives into messages of social alliance.
From a genre perspective, the drama emphasizes its gamified genre by blending survival game elements of original webtoon’s school teen drama and violence narratives. As OTT platforms’ deregulation of contents, the drama transformation could realistically depict the cruelty of violence, expressing thriller tension. Additionally, the Girl’s Love (GL) elements between characters made as supplementary narrative which expands the categories of school dramas and contributes to formation of fandom, showcases mixture of genres.
However, the analysis of viewer responses through YouTube comment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Rather than the messages that the drama wants to convey or the value of its narrative, higher focus is placed on other factors like the actors’ acting skills, casting issues, and visuals. LDA topic modeling results further show tightly connected clusters of character-centric keywords, revealing that the reception of the drama’s narrative and thematic intentions is determined by the actors’ and characters’ combined appeal and popularity.
- COLLAPSE
본 연구는 인기 웹툰 <피라미드 게임>이 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임화 설정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 중심의 서사 방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시각적ㆍ매체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은 학교 내 계급 형성이라는 ‘게임’ 설정을 통해 시청자의 높은 몰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한 성공적인 드라마 전환 콘텐츠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원작 웹툰의 게임화 서사 장치와 인물 내면 서사가 드라마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전환 전략을 구상했는지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웹툰<피라미드 게임>은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핵심 서사 장치로 활용하여 학교를 비일상적인 공간의 ‘게임판’으로 전환하고 독자의 유희적 몰입을 유도하는 전환 방식을 구현하였다. F등급인 최하위는 ‘왕따’가 되어 폭력, 괴롭힘 등이 강제화된다. 이는 현실 사회의 계급주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비판적인 인식의 담론을 제시한다. 웹툰에서는 초점화와 동일시 기법을 통하여 캐릭터 심리와 상황에 극적인 몰입을 이끌어냈으며, 댓글, 별점 등의 상호작용의 ‘유희적’ 요소를 통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 독자들은 마치 플레이어가 된 듯한 강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다.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은 이러한 웹툰의 게임 규칙을 핵심 서사 장치로 활용하여 드라마 매체에 맞게 좌석 배치, 교복 디테일 등으로 ‘등급 시각화’를 통해 시청자에게 게임의 잔혹성을 직관적으로 인지시키는 시각적 재구성 구현 전략을 구사하였다. 투표 과정은 긴장감 있는 배경음악과 함께 ‘의례화’ 시켰으며, 발표 장면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드라마틱한 연출을 통해 몰임감을 높였다. 복잡한 게임 규칙은 애니메이션과 그래픽을 활용한 ‘인포그래픽적 표현’으로 입체적인 효과로 연출하였으며 ‘등급에 따른 캐릭터의 시각적 차별화’를 통해 계급 내의 관계를 명확히 부각시켰다. 또한, 단순한 캐릭터 중심의 웹툰의 재현을 넘어, 드라마만의 독창적인 감정선 전략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성수지의 감정선은 ‘절망에서 해방’으로 역동적인 전환을, 명자은은 ‘숨겨진 저항에서 공개적인 연대’로의 점진적 변화를 선보였다.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는 이 두 감정선이 교차하며 개인적 성장을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는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는 시너지를 창출했다. 장르적 측면에서는 원작의 학원물, 학교폭력 서사에 서바이벌 게임 요소를 강하게 혼합하며 ‘게임화’ 장르 속성을 극대화했다. OTT 플랫폼의 수위 규제 완화 덕분에 학교폭력의 잔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스릴러적 긴장감을 더했으며, 캐릭터 간의 백합(GL) 코드를 부가적인 서사로 가져와 기존 학원물의 범주를 확장하고 팬덤형성에 기여하며 장르적 혼종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피라미드 게임>의 성공적인 전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웹툰 기반 콘텐츠의 드라마 전환 기획 시, 내러티브, 시각화, 장르 구성의 균형이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
Webtoon of <Pyramid Game> - Research of Drama Transformation Strategy and Viewer Response -
-
-
Is an OTT Drama a Television Series or a Film? - The Transformation of Emotional Narratives and the Theoretical Reconfiguration of Literature -
OTT 드라마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 감정 서사의 전환과 문학의 이론적 재편 -
-
Yang, Jin Mun
양진문
- This paper explores the affective turn in contemporary narratives through the analysis of OTT (Over-The-Top) dramas, examining their implications for redefining literary …
본고는 OTT 드라마를 중심으로 현대 서사의 감정 중심적 전환과 문학 이론의 재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드라마와 영화의 전통적 경계가 …
- This paper explores the affective turn in contemporary narratives through the analysis of OTT (Over-The-Top) dramas, examining their implications for redefining literary theory. The emergence of OTT platforms has blurred traditional boundaries between drama and film, leading to a new narrative paradigm that prioritizes emotional and affective storytelling. OTT dramas, designed for binge-watching, employ affective narrative strategies that focus on emotional rhythms and sustained immersive engagement, thereby dissolving genre distinctions between dramas and fil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se changes by analyzing the altered narrative structures and emotional strategies of OTT dramas and examines how platform-based viewing practices influence narrative composition and emotional consumption. Additionally, specific cases illustrate the implementation of genre hybridity through emotion-centered storytelling.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that OTT dramas establish a novel narrative form transcending genre and medium boundaries, potentially broadening the theoretical horizons of literary studies. By analyzing OTT drama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expanding and reshaping literary theory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rther affect-oriented narrative studies.
- COLLAPSE
본고는 OTT 드라마를 중심으로 현대 서사의 감정 중심적 전환과 문학 이론의 재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드라마와 영화의 전통적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OTT 드라마는 감정 서사 중심의 새로운 서사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주행 시청을 전제로 구성된 OTT 드라마는 감정의 리듬과 연속적 몰입을 유도하는 정동적(affective) 서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드라마와 영화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OTT 드라마의 서사 구조 변화와 감정 중심적 전략을 살피고, 플랫폼 기반의 시청 방식이 서사 구조와 감정 소비 방식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감정 중심의 서사 전략을 통해 드라마와 영화의 장르적 혼종성이 구현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작품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OTT 드라마는 장르와 매체를 초월한 새로운 서사 형식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문학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OTT 드라마 분석을 통해 문학 이론의 재편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감정 중심의 서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
Is an OTT Drama a Television Series or a Film? - The Transformation of Emotional Narratives and the Theoretical Reconfiguration of Litera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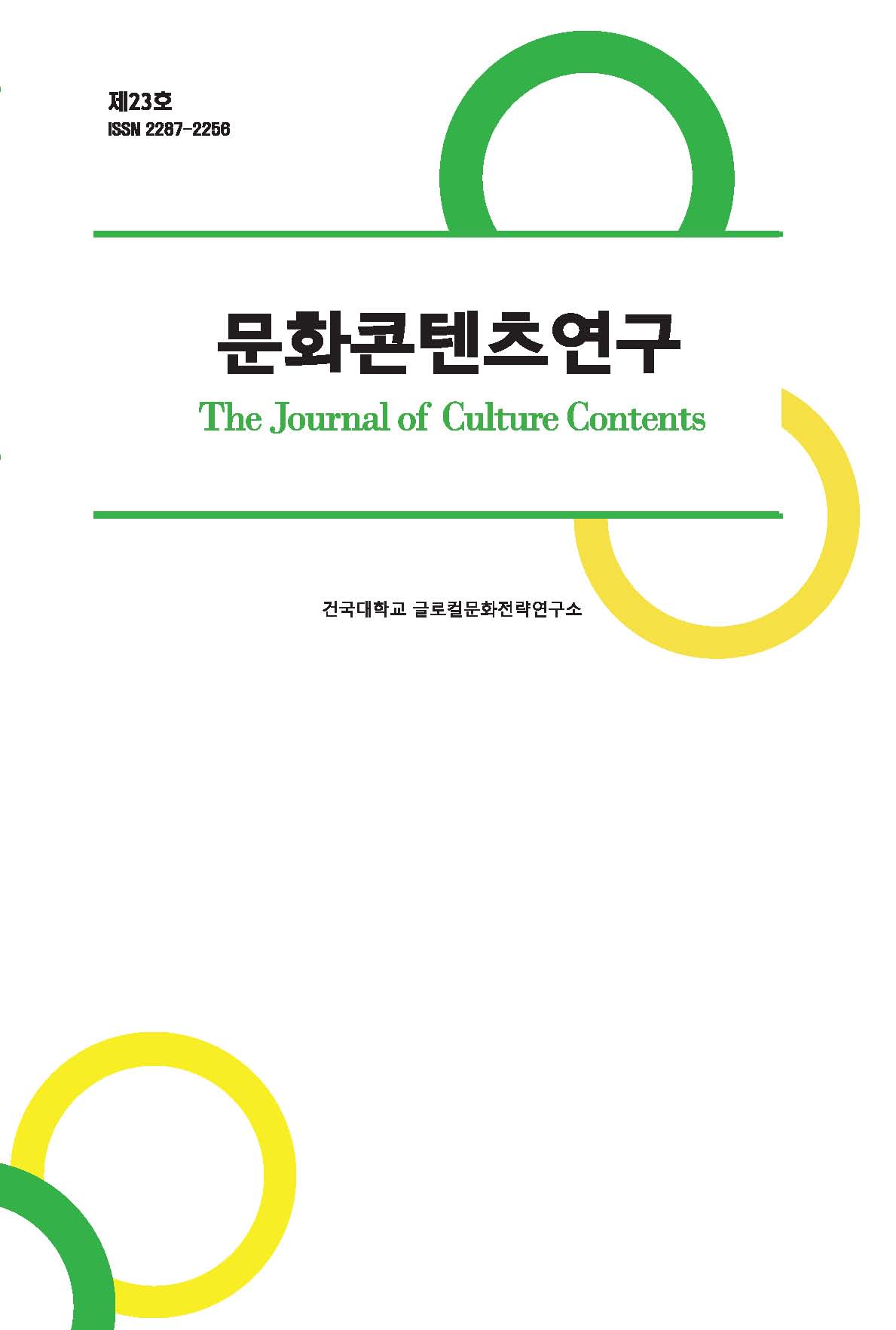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