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ferences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e Korean drama The Glory as an exposé of the oppression and violence structurally embedded in Korean society, analyzing the protagonist's journey through psychoanalytic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To microscopically examine the revenge plot in The Glory,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 of exclusive class formation, which sustains relational permanence. This class structure intensifies the conflicts between characters and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motives and methods of revenge. Therefore, understanding the issue of exclusive class formation will clarify the development and inherent meaning of the revenge plot.
The discussion begins by defining the protagonist, Moon Dong-eun’s revenge as fundamentally sadomasochistic, characterized by a challenge toward an inherently impossible target. Specifically, Dong-eun positions herself as an object of impulse, a tool for the jouissance of the Other. While she attempts direct and ruthless retribution against her perpetrators, this endeavor presupposes her own extreme self-destruction. In this way, Dong-eun strives to regulate her entire life through her own law of revenge.
The significance of revenge in The Glory lies in the coherent implications embedded within its process. The execution of revenge is intertwined with the class structure, progressing logically and consistently at each stage. The protagonist’s retribution reflects a social resonance by reversing the hierarchy of class order and returning the violence and oppression she endured. Nevertheless, The Glory stops short of achieving legal subversion grounded in public restitution, focusing instead on personal vengeance. The protagonist is unable to exact fundamental revenge on the class order behind the perpetrators—the entrenched social structures that breed violence, discrimination, and hatred. This study interprets the narrative outcome as the visualization of the anticipated “impossibility of revenge.”
The discussion begins by defining the protagonist, Moon Dong-eun’s revenge as fundamentally sadomasochistic, characterized by a challenge toward an inherently impossible target. Specifically, Dong-eun positions herself as an object of impulse, a tool for the jouissance of the Other. While she attempts direct and ruthless retribution against her perpetrators, this endeavor presupposes her own extreme self-destruction. In this way, Dong-eun strives to regulate her entire life through her own law of revenge.
The significance of revenge in The Glory lies in the coherent implications embedded within its process. The execution of revenge is intertwined with the class structure, progressing logically and consistently at each stage. The protagonist’s retribution reflects a social resonance by reversing the hierarchy of class order and returning the violence and oppression she endured. Nevertheless, The Glory stops short of achieving legal subversion grounded in public restitution, focusing instead on personal vengeance. The protagonist is unable to exact fundamental revenge on the class order behind the perpetrators—the entrenched social structures that breed violence, discrimination, and hatred. This study interprets the narrative outcome as the visualization of the anticipated “impossibility of revenge.”
본 연구는 <더 글로리>를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고발로 놓고, 주인공의 여정을 정신분석학·사회학적 시선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더 글로리>의 복수 플롯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형성된 배타적 계급 문제를 살펴본다. 이 계급 구조는 캐릭터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복수의 동기와 실행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배타적 계급 문제를 통해 복수 플롯의 전개 양상과 내재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문동은의 복수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을 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사도마조히즘적인 도착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정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은은 자신을 충동의 대상으로, 타자의 주이상스의 도구로 위치시킨다. 실제로 동은은 가해자를 향한 직접적이고 처절한 응징을 시도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의 극단적 파괴를 전제한다. 그렇게 동은은 자기만의 법(복수)을 만들면서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규율하려 한다.
<더 글로리> 복수가 유의미한 이유는, 그러한 복수의 실천이 과정적으로 정합적인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복수의 실행 과정은 계급 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복수의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자신이 입은 폭력과 억압을 계급 질서의 위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명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 글로리>는 사적인 노력을 통한 보복이 있을 뿐, 공적인 회복을 전제한 합법적 전복에는 이르지 못한다. 가해자들의 배후에 있는 계급 질서, 곧 폭력과 차별, 혐오를 낳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복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서사적 귀결을 두고, 예견되었던 ‘복수의 불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주인공 문동은의 복수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을 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사도마조히즘적인 도착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정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은은 자신을 충동의 대상으로, 타자의 주이상스의 도구로 위치시킨다. 실제로 동은은 가해자를 향한 직접적이고 처절한 응징을 시도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의 극단적 파괴를 전제한다. 그렇게 동은은 자기만의 법(복수)을 만들면서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규율하려 한다.
<더 글로리> 복수가 유의미한 이유는, 그러한 복수의 실천이 과정적으로 정합적인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복수의 실행 과정은 계급 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복수의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자신이 입은 폭력과 억압을 계급 질서의 위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명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 글로리>는 사적인 노력을 통한 보복이 있을 뿐, 공적인 회복을 전제한 합법적 전복에는 이르지 못한다. 가해자들의 배후에 있는 계급 질서, 곧 폭력과 차별, 혐오를 낳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복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서사적 귀결을 두고, 예견되었던 ‘복수의 불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 구해근, 『특권 중산층』, 창비, 2022.
- 김석, 『에크리』, 살림, 2007.
- 김은숙 극본, 안길호 연출 <더 글로리> 파트1·2(16부작), 넷플릭스, 2022.12~2023.3.
- 루이 알튀세르, (Pour Marx), 고길환·이화숙, 『맑스를 위하여』, 백의, 1990.
- 루이 알튀세르, (Sur la reproduction), 김웅권,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서, 2007.
- 프레드릭 제임슨,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이경덕·서강목, 『정치적 무의식』, 민음사, 2015.
- 피에르 부르디,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구별짓기-상』, 새물결, 2005.
- 한병철,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 남궁영, 「〈더글로리〉의 드라마 구조와 의미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23.
- 박노현, 「복수사회, 법치와 정의의 무능과 복수라는 권능- 드라마 <모범택시>·<3인칭 복수>·<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2권(제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 윤석진, 「자기 치유로서의 복수극 <더 글로리>」, 『공연문화연구』 제47권, 한국공연문화학회, 2023.
- 윤소영, 「혐오로 읽어내는 <더글로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6권,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3.
- 이다운, 「복수서사의 시대적 특성 및 극적 전략 연구 - 드라마 “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제45권(제1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 정민아,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범조영화 장르의 진화와 폭력의 서사화 방식」, 『현대영화연구』 제23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 정혜원·양윤호, 「메데이아 신화의 스릴러적 변용을 활용한 현대 여성 서사 캐릭터 연구 : 〈더 글로리〉와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97권, 한국영화학회, 2023.
- 조규찬, 「<더 글로리>에 나타난 가해자의 권력과 폭력 연구」, 『어문연구』 제116권, 어문연구학회 2023.
- Bowles, S. and H. Gintis,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 ns of economic life , New York: Basic Books, 1976. - Lacan, Jacques., Ecrits., Trans.,
Bruce Fink ,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2006. - 「‘더 글로리’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TV부문 시청시간 1위」, 『연합뉴스』, 2023년 03월 29일자.
- 「송혜교의 복수극 ‘더 글로리’ 공개 이틀 만에 글로벌 5위」, 『연합뉴스』, 2023년 01월 02일자.
- 「‘더 글로리’ 전 세계서 ‘6억 시간’ 봤다…넷플 상반기 3위」, 『한국경제신문』, 2023년 12월 13일자.
- 「학폭 다뤄 ‘오겜’ 첫 주 기록 깼다...‘더 글로리’의 이변」, 『한국일보』. 2023년 03월 22일자.
- “Review: Netflix’s “The Glory” Is a Revenge K-Drama Highlighting the Pains of School Violence”,
CINEMA ESCAPIST , 2023.06.15. - “Netflix’s “The Glory”: Why It’s Good, and How It Falls Short”,
psychologytod , 2023.03.01.
- Publisher :Research Institute of Creative Contents
- Publisher(Ko)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 Journal Titl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 Journal Title(Ko) :문화콘텐츠연구
- Volume : 31
- Pages :117~143
- DOI :https://doi.org/10.34227/tjocc.2024..3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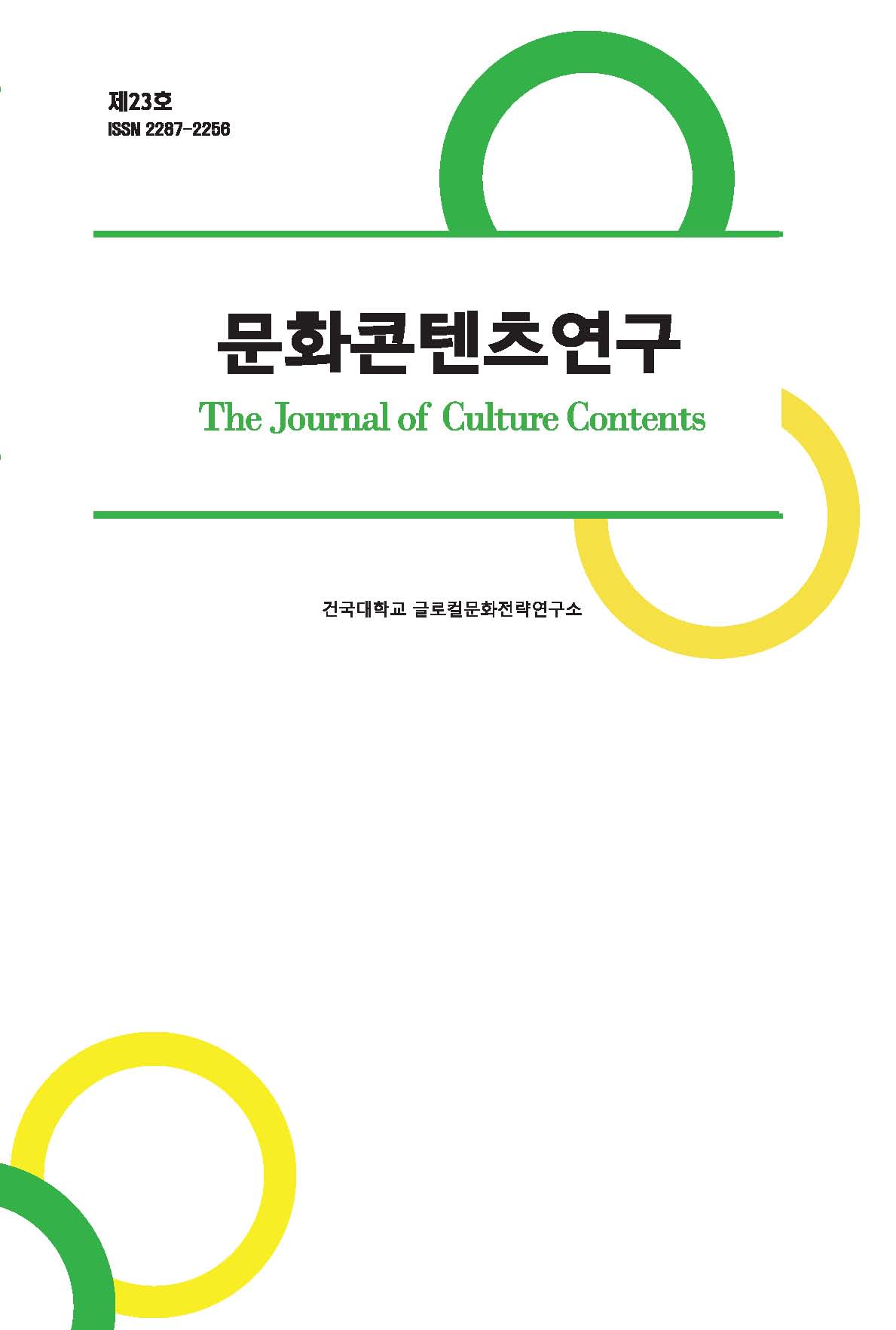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